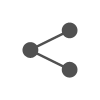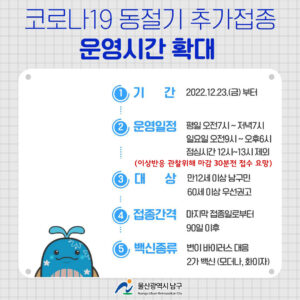|
|
남구주민 김동석
19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해외 펜팔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펜팔이나 우표 수집을 취미로 삼았다. 영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던 나도 여러 종류의 펜팔 가이드 책자를 참고서 삼아 중학교 3학년때부터 해외 펜팔을 시작했다.
펜팔협회에서 소개받은 첫 번째 펜팔 친구는 ‘마유미 가와또’라는 동갑내기 일본 여학생. 그 아이와 처음으로 편지를 주고받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떨리는 추억이다. 얼굴도 모르는 소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집배원 아저씨가 배달해준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살던 마유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종종 자신이 찍은 사진을 동봉하기도 했다. 그리고 매번 편지 말미에는 간단한 일본말 몇 개를 적어줬다. 마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된 듯, 우리는 그렇게 글자로 만남을 이어나갔다.
서로의 편지가 배달되기까지 왕복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초(超) 아날로그적 소통’이었지만 기다림은 힘들지 않았다. 각자의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나눴다. 언젠가는 현해탄을 건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그렇게 삼 년쯤 흘렀을까. 수십 통의 편지가 오고 가던 중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됐다. 그녀도 집안에 사정이 생기며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다.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던, 대구와 아오모리현 간의 역사적 외교문서(?)는 그렇게 단절되고 말았다. 간혹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하거나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면 그 친구와의 순수했던 우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던 마음이 더욱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