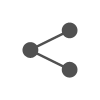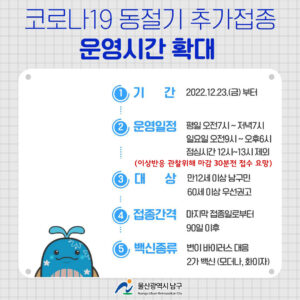남구 명예기자 윤경숙
2022.10.14(금)~11.6(일)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는 철새공원 잔디밭에서 열리고 있다.
매년 ‘태화강 설치미술제’를 찾고 있는데, 해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눈호강은 물론이고 힐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올해 주제는 ‘Field’이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도 아니고 형이상학적 공간도 아닌 문화적 공간이 바로 필드이다.
‘Field’는 형이상학적이고 수직적 숭고를 의미하는 ‘place’에 비해 인문적 공간을 뜻한다.
또한 숲속의 나무를 베어 목축지로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공간은 공동체적이며 인문적이다.
형이상학(신)이 지양된 공간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9명의 작가가 19점의 설치물을 선보인다.
작가와 작품명으로는
01. 강용면 / 온고지신-울림
02. 김무기 / PROPHECY
03. 박서현 / a에서 b에서 a로
04. 박정기 / 평(坪)
05. 박종규 / Noosphere
06. 박청수 / 눈을 감아주세요.
07. 서민정 / 선택 않는#22
08. 오원영 / Crocodile Bird
09. 유성훈 / 세계의 피라미드-인류의 커튼
10. 이상준 /Seven Dippers
11. 장승효 / Art Car
12. 전경표 / Untitled
13. 한지석/ 공기(the air)
14. 한진수/ Dust catcher
15. 파장(울산대B 곽수아, 김명빈, 김아랑, 이강산, 소가현, 유선, 이민우, 이승은, 이채원, 석장미) / 날씨들
16. US_A(울산대A 권유빈, 길혜진, 김보영, 김태현, 박나윤, 손선민, 정다원, 정다은) / Cage Culture
17. OO/ 알%
18. 사니타스 프라디나스니(태국) / Ulsan “Time Field”
19. 바네사 프레이탁(브라질) / Indomitas resting
푸른 잔디(삼호동 철새공원)위가 곧 전시장이어서 자연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울산만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질녘에 전시장을 찾으면 하늘에는 떼까마귀가 군무를 펼치고, 태화강에는 돌아가지 않은 백로떼들이 하중도에 모여 앉아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기도 한다.
자, 그럼 작품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발길 닫는 대로 가서 감상을 하면 된다.
말그대로 자유롭게 감상을 하면 된다는 말이다.
필자는 두 번을 다녀왔는데, 두 번 다 해질녘에 다녀왔다.
일요일 저녁에 한 번 수요일 저녁에 한 번을 다녀왔다.
관람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휴일과 평일에 다녀왔는데, 역시 휴일에 관람자 수가 많았다.
일요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았고, 수요일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했다.

인기가 가장 많은 작품은 단연코 장승효작가의 ‘Art Car’였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장승효작가의 작품에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

장승효작가의 작품은 두 대(폭스바겐 올드비틀, 포르세977)의 명품 자동차 겉면에 콜라쥬 작업 및 듀퐁 클리어코팅 기법을 사용해 전혀 새로운 감각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섬세하고 정교한 콜라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콜라쥬의 이미지는 동서양의 모든 문명의 총체성을 상징한다.

이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다가 서민정작가의 ‘선택 않는#22’ 작품 앞에서 저절로 발길이 멈춰섰다.
서민정작가는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비엔날레와 미술관에서 초대받아 온 대표적인 영상작가이자 설치미술가이다.
‘선택 않는#22’작품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대화를 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했다.
기존에 있던 뽕나무에 데크를 설치하고, 뽕나무의 나뭇잎에 메세지를 새긴 작품으로 바람에 따라 빛에 따라 새겨놓은 메세지가 보였다 안보였다 한다.
관객은 메세지를 읽기 위해 자연속으로 더 깊게 다가가게 된다.
메세지를 찾아 읽는 순간이 관객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작가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다.

메세지를 찾는 순간 “찾았다. Yes!!!”다.
묘한 희열감이 느껴진다.
눈으로 자연을 느끼고, 눈으로 느낀 자연을 입으로 외치게 된다.
“독자 여러분, 사진속의 메세지를 한 번 찾아 보실래요?”